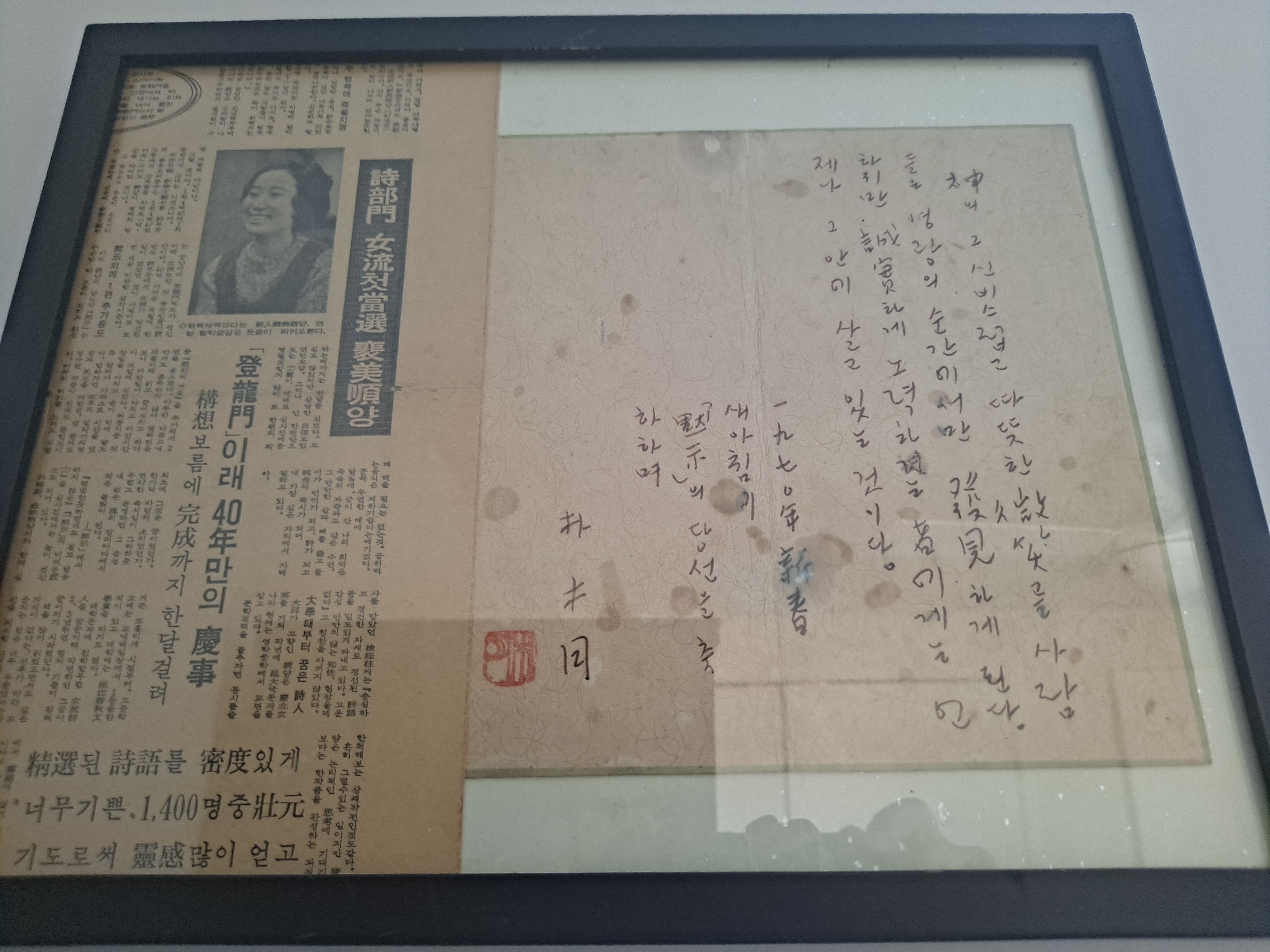
해거름에 부서지는 산그늘
그 깊이속에서 나는 보았네.
오래 잠들고 있던 잔별들
손가락사이로 빠져 달아나고
바람이 몰고 온 겨울저녁을
갈대는 하얀 머리를 날리다 떨고 있었지.
추수가 끝난 빈 들녘에 남아 있던
내 긴꿈의 뼈아픈 목울음
아직도 살아서 소리치는가.
오오래 풀리지 않는 안개같은 하루를
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가.
눈처럼 차오르는 그대 영혼의
맑은사랑
내 눈물끝
빛나는 목숨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
드디어
나를 천상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린다.
문득 우연한 때에
달빛에 금이 간 나의 회억은
죽음의 과즙과도 같은 수면,
그 단단한 살과 뼈를 뚫고 들어가
언어가 되고, 시가 되고
순금의 묵시가 되어
내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맥질하고 있다.
아,
최초에 그것은 꿈이었던가.
한가닥 바람의 소리였던가.
연약한 속삭임이 그러하듯
두렵고 분명하던 그 음성
내 젊은 혼의 갈피마다에서
작은 불빛이 된다.
대지여
그리고 또 하늘이여,
이 아름다운 감격을 위해서는
그대 눈물도 그쳐다오.
그대 틈서리도 막아다오.
겨울아침
낙엽을 견디는 나무되어
모든 것을 믿고 생각하여
내 생애의 길고 빛나는 그림자를 남기고 싶다.
사자의 영혼울 지키며
오랜 교회가 노을 속에 멀 듯이.



 ’살아가는 이야기’ 칼럼을 다시 시작하며 /배미순 편집장
’살아가는 이야기’ 칼럼을 다시 시작하며 /배미순 편집장





